카테고리 없음
이대로 가면 대정전 옵니다 (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)_By Lilys AI
꿈꾸는 투자자2
2024. 10. 15. 23:16
반응형
https://youtu.be/T_6DWm11BZU?si=QL_t9oz9e7t0jW-3
이 영상은 한국의 전력수급 문제와 송전망의 중요성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. 전문가와의 대화를 통해 송전망 구축의 어려움, 전력 이민에 대한 관심, 데이터 센터의 증가로 인한 전기 수요의 급증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우리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. 특히, 현재 송전망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력 공급의 불균형과 전력 부족의 위험성을 인식하게 합니다. 전기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데 관심 있는 이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.[0]
핵심주제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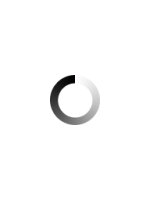
[0]
타임라인
1. 🔌 전력 문제와 송전망의 부재00:00:00
- 최근 10년간 36개의 송전로가 필요했지만, 3개만 건설되었다.
- 전력 발전은 이루어지고 있으나, 송전망이 부족해 전기 공급에 차질이 있다.
- 송전망의 부재로 전력 불균형과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.
-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.
- 김상훈 기자는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대안을 모색한다.[0]
2. ⚡ 한국 전력 소비 구조의 불균형00:01:48
- 최근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전력 수급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.
- 수도권은 전력 수요가 많지만 발전량은 27%에 불과하다.
- 그래서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다.
- 특히 영남, 강원, 충청 지역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.
- 이런 불균형은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위협한다.[1]
3. ⚡ 수도권 전력 공급의 불균형 문제00:03:22
- 수도권 전체 전기사용 비중은 약 60%로 추정된다.
- 인천 지역은 전력 사용 비율이 약 300%에 달한다.
- 서울 지역은 전기사용 비중이 5%에 불과하다.
- 경기도의 전기사용 비중은 약 30% 정도다.
- 수도권 내 송전망 구축은 주민 반발로 인해 어렵다.
- 대규모 발전소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만 건설 가능하다.
- 송전망 설치가 과거보다 어려워지면서 전력 공급이 불균형을 초래한다.[2]
4. ⚡️ 한국의 전력 송전 문제00:05:23
- 2007년 미송전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됐다.
- 2014년 정부의 행정 대집행 이후 송전탑 건설이 사실상 어려워졌다.
- 수도권의 전력 공급은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송전탑을 통해 이루어진다.
- 동해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주요 송전선은 765kV와 345kV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.
- 송전선의 송전 용량은 제한되어 있어, 안전한 송전은 7.3GW로 추정된다.[3]
5. ⚡️ 수도권 전력 송전망 문제00:07:39
- 수도권에 전력을 전달할 발전소는 16GW를 생산할 수 있지만, 실제로 송전 가능한 용량은 7.3GW에 불과하다.
- 동해시 석탄 화력 발전소는 송전망 문제로 2017년 이후 감발되고 있으며, 다른 석탄 발전소들도 여름철에만 간헐적으로 운영된다.
- 최초 계획에 따라 2009년에 76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완공될 예정이었으나, 주민 반대로 무산되었다.
- 대안으로 2015년에 500kV 초고압 직류 전송망의 지중화 계획이 세워졌지만, 서울 경기도에서는 인허가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.
- 1단계와 2단계 사업은 각각 2021년과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이었으나, 현재 2027년이나 2028년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.[4]
6. 💡 수도권 전력 수급 문제와 발전소의 경제적 보상00:12:04
- 수도권은 데이터 센터의 증가로 전기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. 그래서 이를 충당하기 위해 동해안, 서해안의 발전소 전력을 송전해야 한다.
- 송전망 구축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. 그러므로 전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.
- 전력을 끌어오지 못해 발전소가 놀고 있을 경우, '발전소가 돈을 벌지 못한다'고 생각할 수 있다.
- 그러나 발전소는 가동하지 않아도 한전에서 '용량 요금'이라는 보상을 받는다. 그래서 발전소는 고정비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.
- 전력 거래 공공 기관은 필요할 때 발전소에 급전 지시를 내린다. 이로 인해 발전소는 대기 상태에서 용량 요금을 받으며 경제적 안정을 유지한다.[5]
7. ⚡ 전력 손실과 송전망 문제00:13:46
-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약 3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.
- 박종배 교수는 연간 6천억에서 8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.
- 발전소는 잠재적 사고에 대비해 여유 있게 지어야 하지만, 송전망 문제로 가동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.
- 이런 상황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심화된다.
- 송전망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당장은 임시방편을 고려해야 한다.
- 데이터 센터의 수요 증가로 인해 경기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.[6]
8. ⚡️ 데이터 센터의 수도권 집중 이유00:15:41
- 미국은 전기요금이 싼 지역인 버지니아에 데이터 센터가 집중되어 있다.
- 한국은 전기요금이 전국적으로 동일해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 주로 세워진다.
-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 주요 이유는 67%가 부동산 개발 기회를 선점하려는 것이다.
- 수도권에 데이터를 센터를 설정하면 운영 비용이 동일하므로 시골 지역으로 이동할 필요성이 없다.
- 수도권의 인력 및 시설 접근성이 기업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한다.[7]
9. ⚡ 수도권 전력 수요와 데이터 센터의 영향00:17:20
- 수도권의 전력 수요는 이미 아슬아슬한 상태이다. 그래서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가 몰리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.
- 2059년까지 데이터 센터 수요는 약 50GW로 예상되며, 이는 2023년 여름 최대 전력 수요의 절반 수준이다.
- 이렇게 되면 송전망을 두 배로 깔아야 하지만,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.
- SMR 원전을 수도권에 짓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나 경제성과 주민 수용 문제가 있다.
-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지방의 전기 요금을 더 싸게 책정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.[8]
10. ⚡️ 지역별 차등 요금제와 송전망 문제00:19:36
-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송전망 비용을 반영하여 공정한 요금을 부과하려는 시도입니다.
- 송전망은 설치와 유지 비용이 높기 때문에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 것이 상식적입니다.
- 과거에는 전기를 공공재처럼 인식하여 저렴하게 제공했지만,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.
- 데이터 센터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분산시키려는 법이 제정되어 송전망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.
- 최근 법 개정에 따라 송전망 공급 거부 권한이 생겼으나 한전의 입장에서는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[9]
11. ⚡️ 영국과 한국의 송전망 비용 비교00:21:29
- 영국도 수도권 전력 소비가 많고, 발전은 적은 구조로 한국과 비슷하다.
- 영국의 북부 발전소가 많은 전력을 생산하지만, 런던 등 남부가 절반의 전력을 소비한다.
- 송전망 사용료 때문에 북부 지역 전기 요금이 훨씬 저렴하다.
- 북부와 남부의 요금 차이는 두 배 정도 난다.
- 한국에서도 지방 전기 요금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.[10]
12. ⚡ 데이터 센터와 전력 문제 해결 방안00:23:17
- 데이터 센터의 운영 비용 중 20~45%가 전기 비용으로, 지역 간 비용 차이가 크면 이전 검토가 필요하다.
-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소 인근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송전망 없이 저렴한 전력 공급을 고려 중이다.
- 서울의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 전기 요금 인상을 통한 수요 분산이 필요하나, 수도권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.
- 송전망 설치 시 지역 주민의 불편과 집값 하락 문제가, 갈등과 보상 체계의 부재로 이어진다.
- 한국전력이 보상 주체이나, 재정적 어려움으로 충분한 보상 체계 마련이 미흡한 상태로 추정된다.[11]
13. ⚡ 송전탑과 관련한 보상 체계와 문제점00:27:30
- 송전탑 설치 시, 선하지 보상을 위해 송전탑 기준 3미터 안의 땅을 구매한다.
- 재산적 보상으로 송전탑 33미터 안의 토지는 재산 가치 하락을 고려해 보상 협의를 한다.
- 180미터 내 주택 소유자는 집을 팔 수 있으며, 환경 개선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.
- 지역 지원 사업으로 인해 1km 내 주민들에게 전기 요금 보조가 있으나, 각 가구당 월 5,000원 정도로 적다.
- 주민들은 송전탑으로 인한 재산 손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.[12]
14. ⚖️ 한국과 미국의 송전망 갈등 해결 방식 비교00:32:26
- 한국에서는 전기 사업법과 송전법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며, 법적 체계가 명확하다.
- 미국은 법원이 각 사례에 따라 재산적 피해를 인식하고 판결을 내려 판례가 쌓이는 구조이다.
- 전자파가 실제로 피해를 주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.
- 한국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.
- 한전은 적자 사업자이므로 충분한 보상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.
- 전기요금을 올리고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해결책으로 제시된다.[13]
15. ⚡️송전망 문제와 해결 방안00:37:02
- 송전망 비용 문제로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.
- 한국 정부는 송전망 특별법 제정을 고려 중이며 한전의 역할이 한정적이다.
- 미양 송전탑 분쟁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해결되지 않았다.
- 다른 국가들은 중재 위원회를 통해 송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.
- 수도권 전력 의존도가 높아, 전력 공급의 효율적 개선이 필요하다.
- SMR과 같은 대안 기술은 빨라야 2030년에 상용화될 것으로 추정된다.
- 미국은 송전망을 도로나 철도 밑에 깔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.[14]
16. ⚡️ 지역별 차등 요금제의 필요성00:41:15
- 김상훈 기자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.
- 현재의 전력 요금 체계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.
- 송전 선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고 본다.
- 서울과 지방의 요금 차이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.
- 이 주장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히며, 수도권 거주자들이 반대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.[15]
반응형